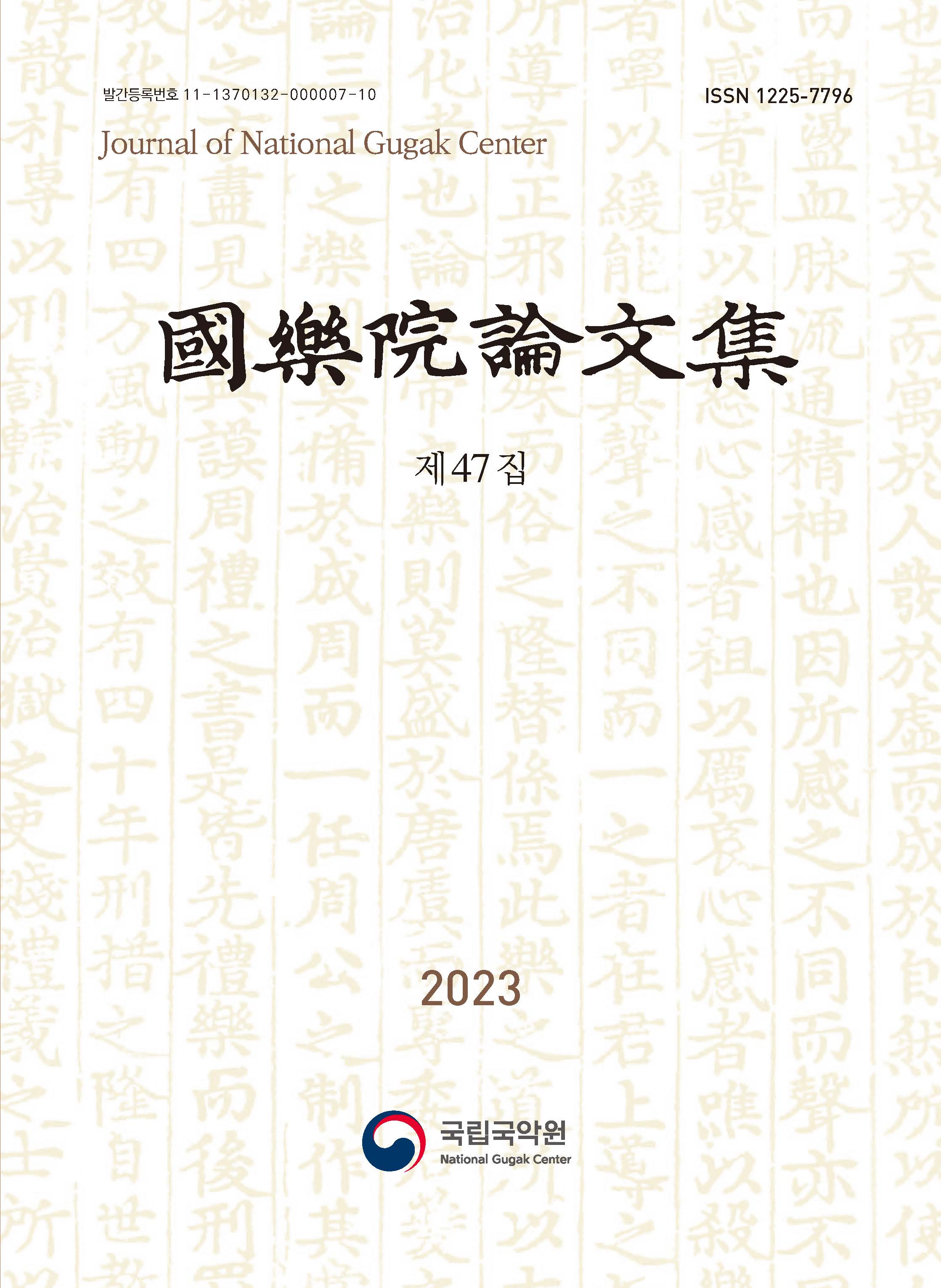삼국사기(三國史記) 악지(樂志)에서 전하는 우륵(于勒)에 대한 기사에서는 한 가지 특이한 어구가 살펴진다. 그것은가야국(加耶國) 가실왕(嘉悉王 또는 嘉實王)이 ‘당(唐)’의 악기를 보고 가야금(加耶琴)을 만들었다고 하는 서술이다. 이러한 서술은 당이 건국된 618년 이후에만 등장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우륵(于勒)의 본향(本鄕)이라는 ‘성열현(省 熱縣)’에 신라의 현(縣)이 두어질 수 있는 것은 644년 9월 이후이고, 삼국사기 지리지(地理志)에는 성열현(省熱縣)의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본적인 읍호가 정해진 685년 이전에 성열현이라는 지명이 쓰였다고 보인다. 음악 관련 문헌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을 음성서(音聲署)로 본다면, 이 기록의 탄생은 음성서(音聲署)에 공식적으로 대사(大舍)가 두어졌다고 한 시점인 651년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삼국사기 악지의 우륵 관련 기사를 다시 살펴보면, 그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인명인 계고(階古)・주지(注 知)는 대나마(大奈麻, 관위 17위 중 10위)로, 만덕(萬德)은 대사(12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만덕의 관위가 음성서의 대사에 대응하는 관위이며 그 상위에 2인의 상관이 자리하는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651년으로부터 100 년에 가까운 시간이 앞선 550년대 무렵에도 음성서의 원형적 조직을 살펴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651년이 될 무렵 달라진 점은, 앞서 추론한 것처럼 삼국사기 악지의 우륵 관련 기사가 쓰였다고 추측되는 점 그 자체로부터 미루어신라 음악이 문서화・역사화・체계화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대사의 상위에 대나마 2인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음성서의 장관이 687년 경(卿)으로 개편되기 이전 장(長)일 때의 상황을 추론하였다. 그 점에서 664년 등장하는 성천(星川)에 주목하였는데, 이 인물이 등장하는 서술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성천은 대나마에 상응하는 인물로서 계고・주지의 사례와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음성서의 경(卿)의 관위를 급찬(級飡, 9위)~아찬(阿飡, 6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장(長)에서 경(卿)으로 개편되며 해당 관직의 위격이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문서화・역사화・체계화의 과정에동반한 것이었고 그렇기에 처음에는 일시적인 음악 관련 업무의 확대에 힘입어 승격되었다고 여겨지는 음성서의 경(卿) 도, 그러한 역사적 흐름에 힘입어 계속해서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 위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According to the article on Ureuk (于勒) recorded in 'Akji' (樂志, music section) of Samguksagi (三國史記), there is the statement that King Gasil (嘉室王) had invented gayageum (plucked zither) after seeing musical instruments of ‘Tang (唐).’ It is clear that this statement could only appear after 618 when the Tang Dynasty was founded. Moreover, it is after September 644 that Silla's hyeon (prefecture) can be placed in Seongyeol-hyeon, which is the hometown of Ureuk. Since the name of Seongyeol-hyeon does not appear in the 'Jiriji' of the Samguksagi, it seems that the place name of Seongyeol-hyeon was used before 685 when the basic town name of the 'Jiriji' of the Samguksagi was decided. From the perspective of organizing music-related literature, if the writing of this document is regarded as Eumseongseo (音聲署), it seems that the birth of this record is related to 651, the point at which it was officially said that daesa (大舍) was placed in Eumseongseo. In that article, it is also found that gyego (階古) and juji (注知) were recorded as daenama (大奈麻, the 10th grade in the 17-grade system of Silla) while mandeok (萬德) as daesa (12th grade). However, in that mandeok 's official position corresponds to daesa of the Eumseongseo and a structure in which two superiors are located at the top can be found, it is believed that the prototype of the organization Eumseongseo was found even around the 550s, which is almost 100 years from 651. What had changed around 651 was that Silla music was documented, historicized, and systematized, judging from the point at which it was presumed that an article related to Ureuk in 'Akji' was written, as inferred earlier. In additio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are at least two people at the top of daesa , it is inferred the situation when the minister of Eumseongseo was jang (長) before being reorganized into gyeong (卿) in 687. In this regard, attention was paid to Seongcheon (星川), who appeared in 664.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narrative in which this character appears, Seongcheon is considered to be a character corresponding to daenama and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the cases of gyego and juji . Considering that the official position of gyeong in Eumseongseo corresponds to geupchan (級飡, 9th grade) to achan (阿飡, 6th grade), it is thought to give a clue that this is reorganized from jang to gyeong , and the position of the official has risen. It is believed to thank to the process of documentation, historicization, and systematization mentioned above. Therefore, gyeong of Eumseongseo, which was initially promoted thanks to the temporary expansion of music-related business, was able to maintain its prestige not only in the short term but also in the long term, thanks to such historical tre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