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후기 충주 사족의 서원활동 : 누암서원을 중심으로
Seowon Activities of Sajok in Chungju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ing on Nuam Seowon
- 충주문화원 부설 충주학연구소
- 충주학연구
- 2023년 제2호
-
2023.129 - 48 (40 pages)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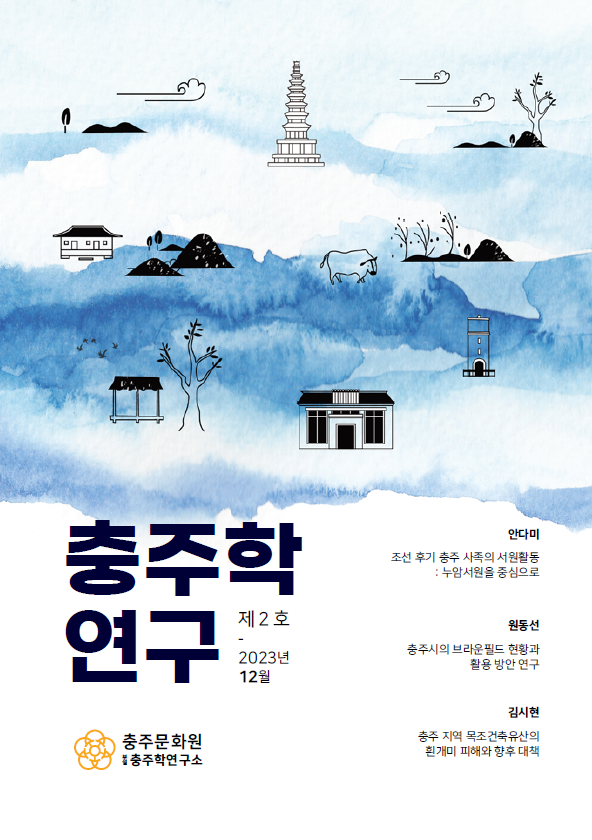
충주는 지리적으로 서울, 경기도와 가까운 지역이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 덕분에 충주에는 서울 출신의 사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낙향의 근거지로 충주를 선택하였다. 17세기 이후에 충주로 이주해 온 사족들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 충주와 한양, 경기도 등지를 자주 오고 갔다. 그 결과, 충주는 17세기 이후까지도 향리 세력이 강성하여, 다스리기 어려운 고을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다. 숙종 20년(1694) 갑술환국(甲戌換局)을 계기로 충청도 지역에서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서원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송시열의 문인들은 스승을 선양하는 서원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충청도 내에서 여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의 중심에는 충주 지역 출신인 권상하(權尙夏, 1641~1721)와 정호(鄭澔, 1648~1736)가 있었다. 권상하는 가장 먼저 화양서원(華陽書院)을 설치하였으며, 정호는 자신이 거주하던 충주 누암리에 누암서원(樓巖書院)을 설치하였다. 숙종 2 0 년 에 정호를 중심으로 충주 사족들은 송시열과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을 배향하는 서원을 설치하는 일을 논의하였다. 송시열은 충주 목사를 역임한 이력이 있었고, 민정중은 충주 출신 사족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충주의 풍속 교화에 앞장섰던 이력이 있었다. 이렇게 정호를 비롯한 충주 사족들이 당시에 송시열 서원을 설치하려던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호서 지역 내에서 연산의 돈암서원(遯巖書院)을 중심으로 한 김장생 문인들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견제 의식이 숨어 있었다. 한편, 충주 사족의 서원 설치논의는 국가의 정책적인 이해에도 부합하였다. 국가는 충주가 상대적으로 향리 세력이 강성한 곳이었으며, 충주 사족이 잦은 변란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새로운 공간으로 서원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처럼 숙종 21년(1695)에 완공된 누암서원은 정호를 비롯한 충주 사족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서원을 중심으로 학문 사상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18세기 이후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가령, 정조 19년에 민중혁이 대표로 하여 정호를 누암서원에 추가 배향하는 문제를 조정에 보고하였다. 정호의 추가 배향은 당시에 권상하 문인들이 황강서원(黃江書院)과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을 중심으로 학문 사상을 강화해 가는 것에 대한 충주 사족들의 일종에 경계 의식이 반영되었다. 충주 사족은 ‘주자-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학 계보 위에 ‘주자-이이- 김장생-민정중-정호’를 배치하여, 충주만의 도학 계보를 정립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정조 19년에 정호의 추가 배향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학(邪學)이 유행하던 당시에 국가의 정책 이데올로기인 주자학(朱子學)의 보급을 위해 전초기지가 필요했던 조정의 입장도 반영되었다. 즉, 정호의 추가 배향은 충주 사족과 국가 정책의 이해가 합치된 결과였던 셈이다. 이처럼 누암서원은 지방 사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려던 충주 사족의 이해와 한양과 밀접한 지역인 충주에 주자학적 이데올로기 보급을 통해 향촌 풍속 교화를 완성하고 충주 사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던 국가의 정책적인 이해가 합치되어 설치되었으며, 서원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활동들 역시 국가 정책과 사족들의 이해가 합치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Chungju city was geographically close to Seoul and Gyeonggi Province. Because of this geographical advantage, many Aristocratic families from Seoul lived in Chungju. In particular, they chose Chungju as their base in times of political turmoil. The Sajoks (the well-bred families), who moved to Chungju after the 17th century, frequently moved back and forth between Chungju, Hanyang, and Gyeonggi-do depending on political changes. As a result, Chungju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more difficult provinces to govern, with strong Hyangri forces even after the 17th century. With the advent of Gabsul Hwanguk in the 20th year of King Sookjong’s reign, the number of Seowon of Song Si-yeol (宋時烈, 1607-1689) increased dramatically in the Chungcheong province. The disciples of Song Si-yeol set up a Seowon in honor of their master, and on this basis they sought to seize control of public opinion in Chungcheong Province. At the center of these efforts, there were Gwon Sang-ha (權尙夏, 1641-1721) and Jung Ho (鄭澔, 1648-1736), both from the Chungju region. Gwon Sang-ha established Huayang Seowon first, and Jung Ho established the Nuam Seowon in Nuamli, Chungju, where he lived. In the 20th year of the Suzong dynasty, the Sajoks in Chungju region, led by Jung Ho, discussed the establishment of a Seowon to honor Song Si-yeol and Min Jungjoong (閔鼎重, 1628-1692). Min Jungjoong, Song Si-yeol had been a pastor in Chungju, and Min Jungjoong was a member of the Sajoks from Chungju. Both had a history of leading the way in the cultural and moral development of Chungju. As such, the local aristocrats of Chungju, including Jung Ho, had various reasons for establishing the Seowon for Song Siyeol at that time. While there were political motivations, they also harbored a sense of checks and balances against the growing influence of scholars and literati centered around the Donam Seowan in Yeonsan in the Honam region. On the other hand, the discussion of establishing a Seowon by the Sajoks in Chungju also served the policy interests of the state. The state agreed that Chungju was a relatively strong region of the Hyangri forces, and the Sajoks in Chungju were involved in frequent disturbances, thus, they saw the nee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eowon as a more efficient means of managing them. As such, the Nuam Seowon, completed in the 21st year of King Sookjong’s reign (1695), was the result of the convergence of interests of the Sajoks in Chungju, including Jung Ho, as well as the interests of the state. This attempt to reinforce academic thought around the Seowon, becomes more evident after the 18th century. For instance, in the 19th year of King Jeongjo’s reign, there was a report to the court about the issue of Min Joong Hyeok, who represented the people, advocating for the addition of Jung Ho to the Nuam Seowon. The addition of Jung Ho to the Seowon was reflective of the Chungju Sajoks’sense of caution at the time, in response to the strengthening of academic and ideological influence among scholars led by Kwon Sang-ha at the Hwanggang Seowan and Han Won-jin(韓元震, 1682~1751). Gwon Sang-ha Jung Ho Min Jungjoong Kim Jangsang Kim Jangsang. The Sajoks in Chungju aimed to establish their own scholarly lineage within the broader Confucian academic tradition that followed the lineage of ‘Zhu Xi -Yi Yi- Kim Jangsang- Min Jungjoong- Jung Ho by placing ‘Zhu Xi -Yi Yi- Kim Jangsang- Song Si-yeol- Gwon Sang-ha’. Moreover, the success of adding of Jung Ho to the Seowan in the 19th year of the reign of King Jeongjo, also reflected the position of the court, who needed outposts for the dissemination of the state’s policy ideology, orthodox Neo- Confucianism, at a time when Confucianism was in vogue. In other words, adding Jung Ho was the result of a convergence of interests between the Sajoks in Chungju and state policy.
Ⅰ. 머리말
Ⅱ. 충주 사족의 입향과 특징
Ⅲ. 누암서원 건립과정
Ⅳ. 충주 사족의 서원활동 전개
Ⅴ. 맺음말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