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영조대 복수 담론의 변화 - 의무에서 정치로
The Transformation of Revenge Discourse from King Seonjo to King Yeongjo: From Moral Duty to Political Rhetoric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역사문화연구
- 제94집
-
2025.05107 - 134 (28 pages)
-
DOI : 10.18347/hufshis.2025.94.107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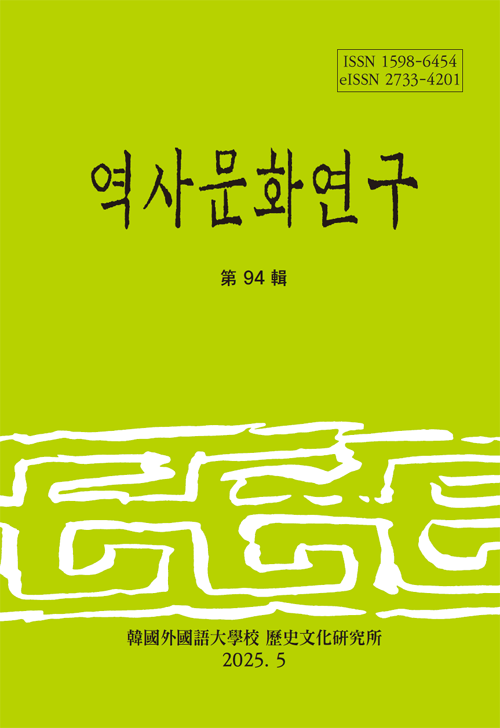
본 연구는 임진왜란 시기부터 영조 재위 초반까지 복수의리의 변화 과정을 분석했다. 조선 전기 사회에서 복수의리에 대한 인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조선 사회에 복수의 도덕적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다. 선조와 조정은 왜군에 대한 복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부형 등 가족을 잃은 백성 또한 효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왜군에 대한 복수를 원했다. 이는 복수의병장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정유재란 시기에는 국가가 나서 왜군에게 원한이 있는 신하와 백성을 모아 복수군을 직접 조직했다. 이는 분의복수군, 복수청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효의 실현을 위한 복수는 충의 실현을 위한 복수로 전환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백성, 신하, 군주 모두 동일한 복수의 대상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복수를 원하는 백성을 국가의 제도 안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서도 복수의병의 모습으로 재등장했다. 몇 번의 외침은 조선 사회에 복수의리를 강화시켰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복수의 대상은 변화했으나, 효종대에 와서 춘추대의에 기반한 복수의리는 북벌론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효종의 승하와 남명의 멸망으로 북벌론이 퇴조하면서 복수의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현종대 김만균이 조모의 원수인 청나라 사신의 행공을 거부하면서 서필원과 송시열을 중심으로 사의·공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는 개인의 복수 의무와 공적인 의무가 충돌한 것이었다. 서필원을 중심으로 하는 한당세력은 효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의보다 충의 실현인 공의를 더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은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노론과 소론에게도 이어지게 되었다. 경종대와 영조 재위 초반 소론과 노론은 대청 복수보다 정치적 복수의리를 강조했다. 경종대 소론은 임인옥사를 일으켜 노론 핵심 세력과 세제를 제거하려고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討逆復讐의 논리를 내세웠다.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하자 상황은 반대가 되었다. 노론은 신임옥사를 일으킨 소론을 처벌할 것을 주청하면서 소론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토역복수를 주장했다. 소론과 노론이 내세웠던 토역복수의 논리는 군주의 의리를 바로 세운다는 명목하에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재편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외침 이후 강화된 복수의리는 도덕적 의무로서 중시되었으나, 북벌론이 퇴조하고 복수의리에 대한 해석이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경종대와 영조대에 오면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discourse on revenge from the reign of King Seonjo to King Yeongjo in the Joseon dynasty, through the framework of a shift “from duty to politics.” During the Imjin War under King Seonjo, revenge was driven by ethical values such as filial piety and loyalty. As the enemy was clearly defined and shared by the people, officials, and the monarch alike, the state was able to institutionalize the desire for revenge, even envisioning the formation of a “revenge army” as a feasible collective project. However, under King Hyeonjong, this discourse reached a turning point. The case of Kim Mangyun reveals a conflict between the private duty to avenge one’s grandfather and the public duty of loyalty to the Joseon state, which maintained tributary relations with the Qing dynasty. The resulting debate over public versus private righteousness (公義 vs. 私義) illustrates that revenge was no longer a purely moral obligation, but rather a matter of political judgment involving diplomacy, national loyalty, and individual ethics. By the time of King Yeongjo, revenge was no longer discussed as a practical or moral issue. Instead, the term bokguseolchi (復讐設置, institutional revenge) had been repurposed as a rhetorical tool within partisan strife, used to assert political legitimacy. Thus, revenge discourse in the late Joseon period evolved from a concrete social duty into a politicized concept, reflecting broader shifts in the political and ethical sensibilities of the era. This study aims to trace the internal transformation of the concept of revenge and its role as a discursive instrument throughout this period.
Ⅰ. 머리말
Ⅱ. 임진왜란기 복수의리와 전쟁 동원
Ⅲ. 복수 담론의 이념적 심화와 분화
Ⅳ. 경종~영조대 討逆復讐와 권력의 재편
Ⅴ. 맺음말
(0)
(0)